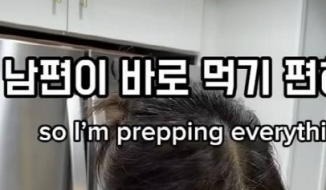연준, 3차례 연속 금리 동결, 내년 3차례 인하 시사
연준 의장 "긴축정책 되돌릴 적절 시기 시야에"
미 채권금리 급락, 달러 약세, 금·유가 상승
|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미국 국채금리도 급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지수는 전장보다 512.30포인트(1.40%) 오른 3만7090.2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 4일의 고점 기록(장중가 기준 3만6934.84)을 약 2년 만에 경신한 것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3만7000선을 상회한 기록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3.39포인트(1.37%) 상승한 4707.09에 마감해 지난해 1월 이후 약 2년 만에 4700선을 회복하며 전고점에 다가섰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0.57포인트(1.38%) 오른 1만4733.96에 장을 마쳤다.
이는 연준이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하고, 내년 중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작용했다.
|
파월 의장은 이어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 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전했다. 향후 금리 인상 종결 지속뿐 아니라 내년 FOMC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 파월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직 아무도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당연하게도 다른 질문, 즉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확히 연준 바깥에서의 논의 주제에 해당하며, 또한 오늘 (FOMC) 회의에서도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 논의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기자 질문에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작성 과정을 소개하며 "이는 (인하 논의의) 사전 토론과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증시 마감 무렵 금리선물 시장은 내년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78.3%로 반영했다. 이날 FOMC 결과 발표 직전 이 확률은 46.7%였다.
미국 채권 금리도 급락했다. 미국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시 마감 무렵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02%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18bp(1bp=0.01%포인트) 급락, 8월 8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같은 시간 4.44%로, 하루 전 대비 29bp나 급락했다.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금값과 국제유가는 동반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