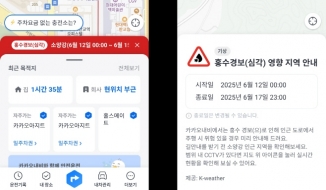|
전시관은 채종과 씨앗마실을 통해 모은 예산의 토종씨앗들이 먼저 관람객을 맞는데, '미래의 가치'인 토종씨앗으로 멋진 세상을 움틔우는 '인문학 강의실' 같았다. 씨앗이 이토록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이렇게 찬찬히 일러줄 수 있을까. 게다가 '씨앗의 역사성을 기록해야 한다'는 박물관의 취지에 공감해 우리나라 토종의 산증인이요, 선구자인 고(故) 안완식 박사가 기증한 씨앗연구자료, 사진자료 등도 잘 전시되어 있어, 씨앗의 정신적 가치를 배우려는 형형한 눈빛들을 이끈다.
|
메밀로 소설가 이효석을 이야기하고, 왕십리 들판에 심은 무는 조선 500년사를 통털어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 허균을, 수박은 소설 '소나기'를 쓴 황순원과 연결시킨다. 감자로는 신경숙의 소설 '감자 먹는 사람들'과 반 고흐의 대표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떠올려준다. '구황작물'인 감자를 제주방언으로는 '지슬'이라 부르는데, 제주 4·3 사건의 아픈 역사를 다룬 오멸감독의 영화제목이기도 한 '지슬'은 제주도 주민들이 한때 온갖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살기 위해 나눠 먹은 안타까운 먹을거리였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감자의 이야기는 110만명이 굶어 죽은 아일랜드 대기근(1845~1852)의 역사로 이어진다. 게다가 1960년대 국제옥수수밀연구소가 일으킨 녹색혁명의 주역인 '소노라 64호 밀'이 우리 토종 키 작은 '앉은뱅이 밀'의 변형물이라는 사실과,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유명한 구상나무도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설명에도 적이 놀랐다. 이 대목에서는 이 박물관의 풋풋한 존재감을 느꼈다. 그건 '씨앗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는 사실을 찬찬히 일러주면서, 맹목적 믿음으로만 '토종'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씨앗을 정의 내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꿈, 희망, 행복이라고도, 인(因)과 연(緣)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시작이면서 끝'인 씨앗을 누구는 '미래의 무기'라고도 했다. 이처럼 씨앗이 가진 은유의 힘은 만만치 않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것 같다가도 바람에 실려가기도 하고, 다른 이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이어줄 듯 하면서도 썩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먹혀버리기도 하는 눈물겨운 역사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이 자연인지, 섭리인지, 역사인지, 혹은 삶인지, 죽음인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씨앗은 언제나 당당하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루에 70여 종의 종자가 사라지는 '씨앗 전쟁' 중이다. '농업생물 다양성의 교두보'인 토종 씨앗을 외면하고, 씨앗 주권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생각 이상으로 혹독할 지도 모른다.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한 문명의 돌파구는 여기쯤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닐까. "토종씨앗박물관이 나라를 지키는 독립군은 아니지만, 씨알의 역사를 간직한 씨앗 수문장은 될 것"이라는 강희진 관장의 말에 나는 맘속 뭉근한 경의를 보낸다.
우리의 토종 씨앗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경건하고 자랑스럽다. '씨앗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는 사실을 찬찬히 일러주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씨앗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며, 많은 이들을 향한 꿈과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씨앗 한 톨마다 화장세계(華藏世界)가 들어 있다고 했던가. 나는 공들여 모은 씨앗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곳을 '뿌린 대로 거둘 박물관'이라고 내 나름의 별명을 붙여본다. 최근에 '콩' 특별전이 열렸는데, 가보진 못하고, '가고 싶어 가슴이 콩콩콩 뜁니다'라고 적은 작은 축하 화분 하나를 보내드렸다.
/前 대구교육박물관장